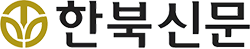피혐(避嫌)의 사전적 정의는 ‘헌사(憲司)에서 논핵하는 사건에 관련된 벼슬아치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로 어떤 벼슬아치가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논핵하는 사건에 관련되면 그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나 사건의 종결을 기다려야 했다.
태종 4년 5월13일 실록기사를 보자.
“원자 좌유 설칭·우유선 김주에게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빈사(賓師)를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일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유선(諭善) 등은 전과 같이 가르치라.”하였다.
설칭 등은 간원(諫院)에서 상소하여 동궁(東宮)의 스승[師]을 두고 덕행(德行)과 도예(道藝)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유선(諭善)·시학(侍學)의 직책에 있게 하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피혐(避嫌)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단지 사간원(司諫院)에서 동궁(東宮)에 실력과 덕행을 갖춘 스승을 골라 세자를 가르치도록 하라는 원칙론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피혐(避嫌)하여 가르침을 중단한 동궁의 유선(諭善) 즉 선생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자 속히 출근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한편 고려·조선시대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면 동일관사(同一官司)나 또는 통속관계(統屬關係)에 있는 관사(官司)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다. 이른바 <상피(相避)>다.
이를테면 숙부가 경기도 관찰사가 되면 양주목사로 있는 조카는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세종 14년 3월26일자 실록 기사는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부터는 이조·병조의 당상관이나 낭청인 관원과 모든 상피 관계(相避關係)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겸직(兼職)·별좌(別坐)·차임(差任)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이미 일찍이 임용(任用)된 자로서 임기(任期)가 만료(滿了)하여 예대로 당연히 해임(解任)되어야 할 자는 사임의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왕명을 기다려 시행하게 하소서”라는 엄중한 규칙 재정 청원이 나타난다.
임금이 전제하는 나라였던 고려, 조선에서 조차 관리들의 업무자세는 이토록 준엄하였다.
비록 자신은 이무 관련이 없어도 또는 오해를 받고 있어도 나아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있다하여도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핵(論劾)하는 일이 벌어지면 현직에서 물러나 스스로 자숙하며 논핵하는 사건 심사에 작건, 크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히 사건이 진행되도록 현직에서 물러나 기다리는 것, 혹여라도 동일 관청에 6촌 이내의 친척이 상(上), 하관(下官)으로 동시에 근무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아예 그런 형태의 복무를 원천 금지하는 것, 이것이 비효율적아고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전근대국가 조선을 500년 넘도록 유지시킨 긍정적 요인의 하나일 수도 있었겠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지닌 사법리스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더 크게 확산해나가는 모양새다.
그 당의 여러 의원들이 검찰,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재판정 뜰에서 아우성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사법당국을 성토하고 심지어는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논핵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피혐(避嫌)하고 스스로의 직무를 정지한 채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던 옛 공직자들의 자세가 다시 바라 보이는 요즘이다.